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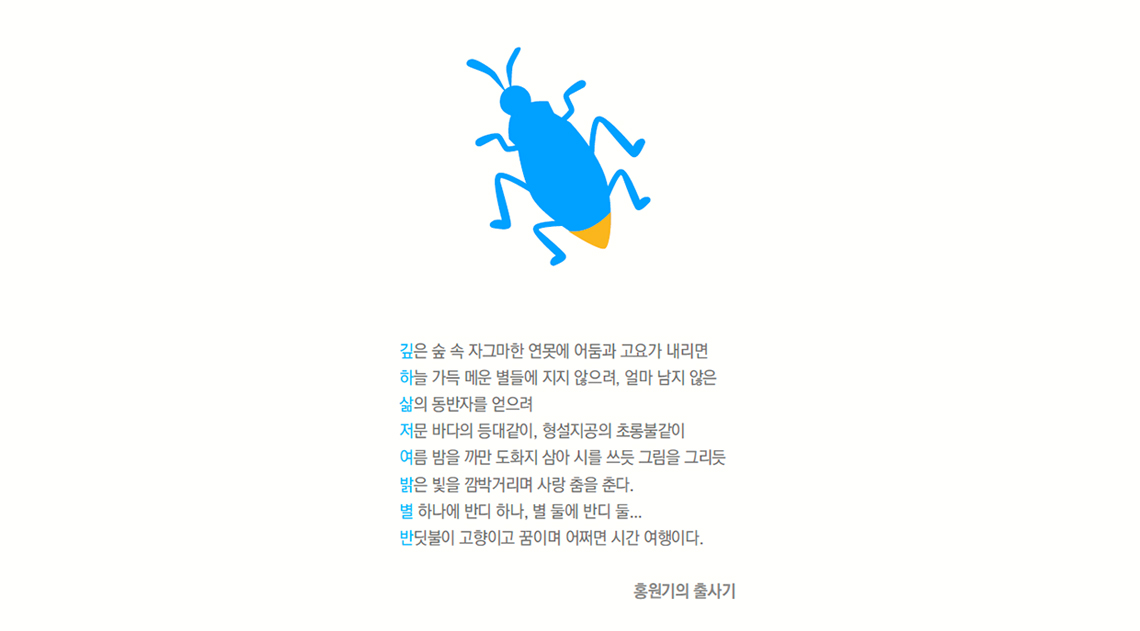

많은 생물은 다양한 방법으로 짝을 찾고 대물림을 위해 나름의 독특한 구애 방법을 고안해 냈는데 그중 반딧불이는 인간의 관점에서 가장 아름다운 방법을 선택한 곤충이 아닐까 한다.
반디, 또는 개똥벌레라고 부르는 반딧불이는 고유종으로 널리 알려진 애반딧불이, 운문산반딧불이, 늦반딧불이가 있다.
애반딧불이는 중부지방 기준으로 6월 초에, 운문산반딧불이는 7월, 늦반딧불이는 8월에 주로 나타난다. 애반딧불이가 10mm 내외로 가장 작고, 늦반딧불이가 30mm 내외로 가장 크다.
늦반딧불이의 암컷은 성충이 되어도 날개가 없어 땅에 붙어서 생활하며, 애반딧불이라도 날아다니는 성충은 수컷의 비율이 높다. 유충이나 날지 않는 암컷 성충, 심지어 번데기도 생체발광을 하여 빛을 내나 풀숲 안이나 땅속에 있어서 잘 발견되지 않는다.
반딧불이의 생체발광은 에너지 효율이 극히 높아서 매우 적은 물질을 분비하여 산소와 결합하여 빛을 내는데, 작은 곤충이 캄캄한 밤에 “나 여기 있소” 하고 빛을 내는 건 상위 포식자에겐 손쉬운 먹잇감처럼 노출되지만, 나름의 방어기제를 갖추고 있다.
밤에는 비행속도가 느려 손으로도 쉽게 잡을 수 있지만, 좋은 것은 없다.
특히 반딧불이는 위험에 처하면 독특한 독성물질을 분비하여 악취를 뿜거나, 심하면 상위포식자가 목숨을 잃기도 한다. 이따금 손을 잡아 두 손을 포개어 그 안에 놓고 관찰하는데 권할 일은 아니다. 그들도 그들의 삶이 있듯, 멀찍이서 조용히 바라봐 주는 것이 좋다.
필자는 여러 곳을 다녀봤지만, 서식지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 지난 몇 년간 화천 근방에서 많이 발견했고, 홍천이나 영월지역의 깊은 숲속, 작은 계곡이 있고, 가로등이 없는 지역에서 주로 발견된다.
인공조명과 소음에 민감하여 조금이라도 부주의하게 다가가면 사라지고 만다.
대부분 작은 시냇물이 흐르거나 깨끗한 습지 주변에서 섭생하고 생체발광을 하는 성충으로서의 삶이 약 보름 정도로 짧다. 그 기간 내에 교미에 성공하지 못하면 죽는다. 아름다운 생체발광은 사실 목숨을 건 위치표시인 것이다.
애반딧불이와 늦반딧불이는 황록색의 빛을 내는데 미묘하게 색이 다르다.
 애반딧불이의 경우 배 쪽에 발광 마디가 수컷은 두 줄, 암컷은 한 줄이다. 유충 시절에는 숲속의 달팽이나, 작은 갑각류, 민달팽이들을 잡아먹는 포식자지만, 성충은 말 그대로 이슬만 먹고 살다가 짧은 생을 맞이한다. 거의 먹지 않고 짝짓기에 집중하고 그 과정에서 생체발광을 하는 것이다. 그만큼 치열하고 절박하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반딧불이를 보더라도 그들 삶의 마지막 며칠을 조용히 지켜보기만 하자. 특히 아이들은 반딧불이를 보면 흥분을 참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기 마련이니, 관찰 전에 사전교육을 잘 해야 한다.
애반딧불이의 경우 배 쪽에 발광 마디가 수컷은 두 줄, 암컷은 한 줄이다. 유충 시절에는 숲속의 달팽이나, 작은 갑각류, 민달팽이들을 잡아먹는 포식자지만, 성충은 말 그대로 이슬만 먹고 살다가 짧은 생을 맞이한다. 거의 먹지 않고 짝짓기에 집중하고 그 과정에서 생체발광을 하는 것이다. 그만큼 치열하고 절박하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반딧불이를 보더라도 그들 삶의 마지막 며칠을 조용히 지켜보기만 하자. 특히 아이들은 반딧불이를 보면 흥분을 참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기 마련이니, 관찰 전에 사전교육을 잘 해야 한다.반딧불이 근처에서는 감탄사조차도 소음이 된다.
발견이 어려운 곤충이라 천연기념물로 오해하는 이가 많은데 천연기념물이 아니며, 무주군 설천면이 서식지로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시골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곤충으로 오죽하면 개똥만큼이나 천한 곤충이었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반딧불이는 지상의 별과 같은 존재로서 점점 우리 곁에서 멀어지고 있다.
하늘의 별이나 지상의 별이나 낭만은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더 쉽게 만나기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서 안타까울 따름이다.어떻게 하면 그들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

